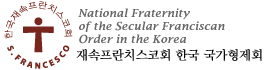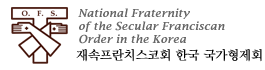자유게시판
글 수 4,097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그 상처가 덫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그런 정조에게 주변의 신하들이 권하였습니다.
"[중용]이라는 글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전하...!"
그런데 [중용]이라는 책을 읽은 뒤에도 상처는 손쉽게 나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도세자(나중에 장조로 추존)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그는 당시의 유학자들과 유생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대체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답장들이 하나 같이 정조의 마음에 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학자가 이엏게 말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즉 정다산이 보낸 편지글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편지를 읽어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전하,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리이며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정조는 다산과 이런 글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른 바 [중용강해]인 것입니다. 천주교신자아자 당대의 유학자요 실학의 선구자였던 정약용의 이 글들은 이렇게 탄샐한 것입니다. 마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