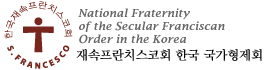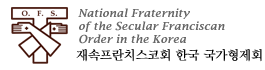자유게시판
글 수 4,098
<< 전 략 >>
그러나 생명이 주는 평화와 기쁨은 관념과 신념만으로 얻을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적절한 물질적 뒷받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먹고 자고, 자식을ㅈ공부시키고, 병을 치료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선대부터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농군들, 그리고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농군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 후략 >>
농민들의 고달픔을 노래한 시를 옮겨본다.
"김을 매니 벌써 한낮
땀방울이 곡식 밑 흙에 떨어지네
누가 알리 그릇에 담긴 밥이
한 알 한 알 농민의 땀인 것을
-이신 '민농'
"이월에 새 고치실을 미리 팔아먹고
오월이면 추수할 곡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네
눈앞의 부스럼은 고칠 수 있겠지만
심장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네
나는 바라노라, 임금의 마음이
부디 밝게 비추는 촛불이 되시어
부자들 잔치 자리 비추지 마시고
흩어지는 농가를 두루 비추소서"
-섭이중, 상전가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은 <<서경>>에 나오는 "생생지락"이다. 세종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왕 노릇'을 하는 대통령이 부디 농가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한 명의 농부가,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생업을 즐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법인 스님(참여사회 편집위원장)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