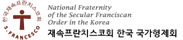동 전
소설가 이순원 글
어릴 때 우리에게 10원이면 참 큰돈이었다.
인사나 심부름으로 돈을모았는데 그때 새해가 되어 학기 초와 봄 소풍 때 두 개 더 모아 일곱 개를 만들었다.
그 돈을 내가 만든 찰흙 저금통 안에 넣어두었는데 일부러 저금통을 깨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 없었고 돈을 꺼내 갈 수도 없었다.
찰흙 저금통을 귀 옆에 대고 흔들면 어린 마음에도 늘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동전과 마른 찰흙이 부딪쳐 그냥 투덕투덕하는 소리가 났지만
어쩌다 동전끼리 허공에 부딪쳐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그러면 그 속의 동전 두 닢이 마치 내 눈앞에서 부딪치듯 기분이 좋았다.
그걸 형제들에게도 흔들어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자랑처럼 흔들어 보였다.
그걸로 무얼 할 거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집안에는 그게 욕심난다고 손댈 사람이 없었다. 욕심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저금통을 따로 보관하기보다 책상 위에 등잔처럼 놓아두었다.
형제들도 누가 놀러오면 그걸 흔들어 보이며 자랑해 어떤 때는 그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공동의 물건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그것이 내 것이어서 마냥 좋았던 기억만 난다.
어제 길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웠다.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 시간 속에 10원짜리 동전이 너무 작아졌거나 내가 그때로부터 멀리 걸어온 것이다.
그래도 어제 주운 10원짜리 동전은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반짝이는 기억 하나를 되돌려주었다.